문과vs이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말이 아니다. 'Dire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peed'는 리처드 L 에반스의 Faith in the future(1963)에 나온다. 비슷한 괴테의 말이라 여겨지는 인용구(있는 자리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우리에게 낯선 올리버 웬들 홈즈 1세(Oliver Wendell Holmes Sr.)의 말이다. |
문이과 대전으로 다시 소환되었던 이 명언은 일반적으로 '괴테'의 말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는 이 명언을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속도'라는 표현이 맞느냐는 것이었다.
속도가 아니라 속력임 (이 무식한...??)
속도는 벡터니까 방향을 포함하는 말이다. 방향과 대비되는 의미니 '빠르기'만 나타내는 '속력'(스칼라량)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
지극히 이과스러운 지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문과생일지는 모르겠으나) 중 가장 탁월한 것은 이것이다(출처: 문과vs이과, 논쟁의 현장).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즉,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벡터값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며, 이는 구성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시 :
*오빠, 고맙긴 한데 나는 가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루이비통과 프라다를 좋아하는 거야.
*아들아,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종이쪼가리가 든 봉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봉투를 좋아하는 거란다.
'속도' 사용이 별문제가 아닌 이유는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는 반박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
일상과 학문, 구분 못하는 건 누구?
원문을 근거로 번역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보자.
영어 원문이 'Life is a Matter of Direction, Not Speed.'로 되어 있다. 벡터인 velocity로 쓰지 않고 speed로 썼으니 스칼라 값이다. 원문을 봐도 '속력'으로 옮기는 게 맞다.
우리 영어사전에 speed를 '속도'로도 옮기고 있다는 건 뭐, 부끄러운 현실일까? (실상 Life is a matter...는 영어권에서 회자되는 표현이 아닌 한국인들이 회자시키는 영어 표현이다)
특정 학문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일상으로 가져올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대체로 '이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막 써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확산된다'는 식이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한 수 가르쳐 줄께'라는 우월의식은 덤.
일상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엄밀한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할까? 글쎄, 모두가 물리학도, 혹은 이과생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걸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점에서 그런 '가르치기식 지적'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뭔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속도'라는 말에 더 익숙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속력이라는 말보다는 속도라는 말을 일상에서 훨씬 자주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구글에서 '속도'와 '속력'을 각각 검색해 보면, '속도'는 1억 건 이상 검색된다. 반면 '속력'은 2백만 건 정도가 검색된다. 약 50배 차이다.
인생을 고민하는 맥락에서 친숙하지 않은 표현마저 더 엄밀한 것이니 가져다 쓰려고 애쓴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에 잘 붙는 말로 쓰게 되기 마련이다.
해당 명언의 '속도'를 '속력'으로 바꾸는 것은 이과생들의 기대와는 달리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근데 괴테가 한 말 맞음?
그런데 이 인용구와 관련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을 괴테가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내용에 대한 정재승 페이스북 게시물에 달린 이 댓글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정재승도 인용하고 있는 영어 인용문은, 위에서 본 'Life is...'가 아니라... 다음과 같다.
The greatest thing in this world is not so much where we stand as in what direction we are moving.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이다.
정확히 그 표현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도 비슷한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진 게 위의 말인듯 하다. 구글링을 해 보면 'I find'가 앞에 더 들어간 문장이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도 괴테가 한 말이 아니라고?
일단 독일어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독일어 인용구로 비슷한 것은 'Es ist nicht wichtig, wie groß der erste Schritt ist, sondern in welche Richtung er geht.'(첫 걸음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가 이야기 된다. 이 표현은 작자 미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구글링으로만 보면 2010년대 이후에 많이 나온다. 그 전에는 찾아 볼 수 없다. 간혹 Samuel Johnson의 말이라 적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누구의 말인가?
방향을 바꿔보자. 이 표현의 원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규명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누가 이야기 했지?"라는 글에서 괴테가 했다는 위 말과 비슷한 말(사실 똑같은 말에 가깝다)을 'Oliver Wendell Holmes Sr.'가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다.
I find the great thing in this world is not so much where we stand, as in what direction we are moving.
그럼에도 글쓴이는 누가 한 말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괴테가 했다고도 회자되지만 greatest와 great의 차이, 쉼표의 차이만 있지 실상 같은 말이다.
찾아보니, 해당 문장은 올리버 웬들 홈즈 1세(1809-1894)의 책 The autocrat of the breakfast-table(1858)에 실려있다.
gutenberg.org에서 해당 책 본문을 찾아 볼 수 있다(아래 참조, 이미지에 링크 넣어 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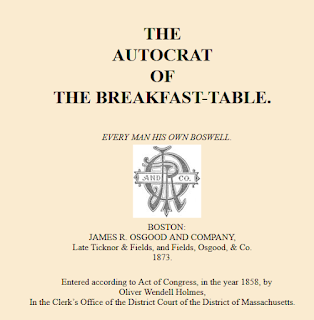 |
| The Autocrat of The Breakfast-Table |
1858년에 출간된 홈즈의 에세이집이다. 해당 인용문은 4장에 나온다.
Internet Archive에서 찾은 1858년 본의 해당 구절은 아래와 같다.
뒷 내용까지 같이 보면,
I find the great thing in this world is not so much where we stand, as in what direction we are moving: To reach the port of heaven, we must sail sometimes with the wind and sometimes against it,—but we must sail, and not drift, nor lie at anchor.
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국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바람과 함께, 때로는 바람을 거슬러 항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표류하거나 정박하지 말고 항해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움직여가야 혹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 글귀가 언제부터 괴테와 연결되었을까?
구글링을 통해서 대강의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1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 한정으로 구글링을 해 보면 딱 두 건의 결과가 나온다.
2001년 게시물이나 2004년 게시물 모두 홈즈를 출처로 말한다.
2001년 게시물에는 또한 비슷한 문장(I find가 빠지고 great가 greatest로 바뀐)을 괴테의 말로 쓴 것도 있다.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 'the greatest thing...'이란 말을 괴테와 엮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the great thing...'이든 'the greatest thing...'이든 모두 홈즈를 출처로 밝히고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Dire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peed)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에서의 최초 용례는 앞의 '누가 이야기했지?' 글쓴이가 지적한 대로 2002년 나온 여행기로 보인다(구글 검색 결과 기준). 다만 책에 쓰인 방식을 보면 회자되는 말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작은 따옴표에 넣어 쓰고 있다).
네이버로 찾아보면 비슷한 표현을 〈국민일보〉의 "[로뎀나무-강준민] 잠시 멈출 줄 아는 지혜"(2000년 7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글에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해당 글을 쓴 목사가 미국 목사라 미국에서 그와 비슷한 표현이, 혹은 비슷한 내용이 유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다.
'dire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peed'와 같은 말들이 미국에서도 회자되고 있었다(your direction is...버전도 많다). 어딘가에서는 Richard L. Evans가 한 말이라 하고 어딘가에서는 저자 불명이라고 이야기한다. 막연한 상황이라 일단 접근 가능한 에반스의 책을 뒤져봤다.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니(Richard L. Evans의 책 중 Internet Archive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찾아봤다), Faith in the future(1963)에서 해당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내용을 강준민 목사가 직접 참고했을지는 알 수 없다. 표현과 내용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에서 쓰인 표현과 더 유사한 표현이 미국에서 이미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다. 물론 저런 표현을 처음 말한 인물이 리처드 L. 에반스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전에도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말 익명의 표현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사용하여 '그 사람이 한 말'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으니 말이다.
결론
한국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표현은 2000년 이후에 확인된다(네이버, 구글 검색).
비슷한 영어 표현으로 미국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는 'dire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peed'가 있다. 이 표현은 리처드 L. 에반스의 Faith in the Future(1963)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표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이런 연결도 '사후적'으로 비슷한 것 찾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the greatest thing...'보다는 더 개연성 있는 연결로 보인다.
'direction is...'보다 관계가 더 멀어 보이는 '있는 자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출처를 찾기 위한 사후적 연결로 보인다. 또 해당 표현의 출처를 괴테로 찾고 있는데, 'the greatest thing...'이라는 말은 홈즈가 1858년에 쓴 책에 나온 'I find the great thing in the world...'가 변형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 해당 표현의 원출처는 올리버 웬들 홈즈 1세라고 해야 할 것 같다.
***
정재승의 페이스북 게시물(2020년 9월)을 보고 언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봐야지 했는데, 이제야 손을 대게 되었다(2022년 3월).
해당 게시물의 이어진 댓글에서 지적하는 패턴이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오귀인(misattribution)의 문제로 말이다.
기억의 오귀인 중 '출처 혼동(source confusion)'에 해당하는데, 기억의 생성과 확산 상의 최적화 특성으로 이해된다. 어떤 기억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은 단서로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용이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귀인된 정보는 그러한 용이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의 저명함이 그와 관련된 정보의 권위를 만들어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보로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기 쉽게 만들어 준다. 게다가 '저명한 사람'은 잘 기억되는 정보이기도 하다.
멋진 말도, 실제 한 사람이 유명하지 않다면 더 유명한 사람을 발화자로 찾게 되는 것 같다. 우리 인식 방식의 이상화(idealizaition) 경향--기억 비용 최소화 경향일 수도--이 바로 이런 인지 작용의 산물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비슷한 패턴은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상적인 표현이어서 잘 회자되는 말이 어느 시기엔가 특정 인물의 발화로 정리되는 경우이긴 하다. 에반스나 홈즈 1세도 어디서 들은 걸 적은 것일 수도 있다. 그 점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내가 이런 효과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이런 기억의 효과, 특히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억의 최적화 과정 속에서 신화, 전설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종교적 현실 인식이 소원과 기대로만(정신승리하는 것)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화된 우리의 기억 메커니즘이 활용되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
이 글은 과거 블로그에 2022년 3월 26일 게시되었던 것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그 글의 제목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문과vs이과 대전...오귀인 문제, 괴테 아닌거야"였다.
.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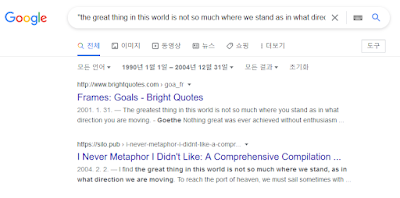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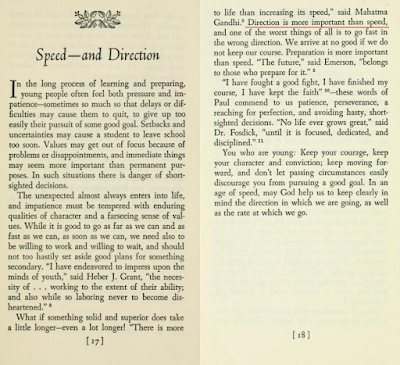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